|
2009년부터 시작한 ‘지켜줘서 고마워’와 2014년의 ‘그때 그 간판’의 세 번째 버전 ‘오래된 그 가게’가 찾아갑니다. 30년 이상 된 가게를 찾아 세월을 들어 봅니다. 한 세대를 넘는 긴 시간 동안 존재해 온 가게에서는 물건만 거래되는 것을 아닙니다. 오래된 가게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숨결이 배어 있고, 이웃 간의 넉넉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그 가게’가 쌓이면 예산의 이야기가 되고, 예산 역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 믿습니다. 예산의 자랑 오래된 가게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편집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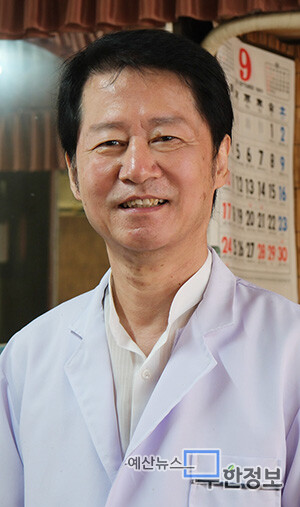
남학생들이 하나 둘 미용실로 발길을 돌린게 1990년대 즈음일게다. 당시 숫기 없는 남학생들이 무서운(?) 아줌마들 틈바구니에 앉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일은 무척 민망했다. 하지만 거울앞에 드러난 결과물은 ‘스포츠머리’도 한올한올이 남다르게 느껴졌다.
중학교 시절, 중요부위만을 간신히 가린 서양 모델이 인쇄된 달력과 달리 큼지막한 숫자가 전부인 일력을 뜯어 면도 뒤 날에 묻은 거품을 닦아내던 손놀림과 특유의 이용원 냄새.
지금도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은 이발 순서다.
처음 자리에 앉으면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빗질을 한다. 가위가 쇳소리를 내며 머리카락을 잘라 낸다. 빗이 모아온 머리카락을 경쾌하게 쳐 낸다. 빗질과 가위질이 되풀이 된다. 숱가위질 몇 번을 거치면 덥수룩하던 머리가 한결 깔끔해진다.
그리고 이용원 만의 특별함, 바로 하얀 가루. 이발기(바리캉) 혹은 전발기로 뒤쪽 머리카락를 만지고 난 뒤에 하얀 가루를 묻혀 장가위로 옆머리 각을 잡고는 뒤통수까지 한 바퀴를 돌아나간다. 그러면 잔머리까지 모두 정리돼 나갔다. 이 부분이 무척 기분 좋았다. 곧 이발이 끝나가는 시간이 됐기 때문이다.
설이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른들 틈에 끼어 이발의 순서를 기다리던 추억도 남아있으리라.
모든 게 무뚝뚝하던 시절, 까슬까슬한 중학생 머리도 부드러운 손길로 다듬어 주시며 어른들의 ‘친절함’을 알려줬다.
고덕 ‘중앙이용원’을 찾았다. 어릴 적 친구들과 그 친구들의 아버지도 찾았던 오래된 이용원.

어릴 적 앉았던 그 오래된 의자는 아니었다. 다만 머리를 감겨주던 세면대 아래의 타일은 예전 그대로다. 무뚝뚝한 첫인사도 오히려 반갑다. 중앙이용원의 이발사 엄태순씨가 1973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니 벌써 50년이 다 돼 간다.
“견습생으로 들어간게 열아홉살 때야, 늦게 시작한거지…. 그때 또래 친구들이 국민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들어가서 기술자 노릇을 했으니까”

그는 배운지 일 년여 만에 기술자가 돼 이용원을 열었다. 다른 기술자들이 종업원으로 머무를 때 그는 용기를 냈다. 지금 생각하면 초가 같은 집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기어코 가게를 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용기로 그랬을까 싶지만, 후회는 없다. 그 용기로 먼저 들어간 친구들은 ‘기술자’가 됐지만 그는 ‘사장’이 됐다.
“400만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지. 지금 고덕초 넘어서 신작로 옆이었어. 그때 제법 재미를 봤지”
가게는 봉산면에서 고덕시장 입구로 옮겼고, 다시 지금의 한내정육점 자리로 옮겼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초 지금 자리인 3층 건물을 샀다.
“70년대에 이발료가 100~150원씩 할 때야. 쌀 한 짝(90kg)에 6~7000원 했지. 하루에 20명에서 30명씩 깍았어. 그때 꽤 돈을 벌었지”

그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을 만큼 준수한 외모였다. 거기다 돈까지 꽤 벌면서 소위 껄렁껄렁한 친구들 사이에도 인기가 많았다고.
그랬던 그가 두 번 마음을 크게 다 잡은 적이 있다. 첫 번째는 아내를 처음 만난 19살 때로, 친구들의 아지트 같은 첫 번째 가게를 접고, 서울로 1년 동안 돈을 벌러 갔었다. 그때 껄렁껄렁(?)한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다.
두 번째는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간 80년대 후반이다. 어느새 훌쩍 자란 아이를 보며 새삼 ‘모범적인 아버지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아침이랑 저녁을 꼭 아이들과 함께 먹기로 했지. 아이들에게 잘하라고만 하면 말을 듣남? 그래서 정신을 차린거지.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운 것 같아”
그의 바람처럼 세 아들 모두 공무원이나 공사에 근무하고 있다. 큰아들이 예산군청에 합격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흐른다.
예전과는 다르게 고덕의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발사) 선배님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고덕 시내에 한 집 밖에 없는 거야. 나 혼자”
70년대에 면내에 7개의 이용원가 있었다. 처음에는 끼어들 틈이 없어 봉산에 이용원를 차려야 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고덕에 하나밖에 없는 ‘이용원’이 됐다.
“인구가 확 줄었지. 80년대는 만명 정도가 살았지만, 지금은 4000명 밖에 안 돼. 게다가 남자들도 미장원에 가서 많이 깎잖아”
고덕면지에 따르면 1984년 1만2690명이던 인구는 1992년 9761명으로 만명의 벽이 무너졌고 2023년 6월 기준 4685명이 살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일하게 남아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는 엄태순씨.
“지금은 반찬값만 버는 거야. 내 건물이니까 월세도 안 나가고 고향에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해. 그래도 근처 사는 손주가 있는데 날 닮아서 그런지 반에서 리더 역할을 해. 반장도 하고, 손주 보는 재미로 살지”
한 가지 일로 한 가족을 일으키고, 자식과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가 걸어 온 길과 고덕의 마지막 이용원로 여전히 문을 열고 있는 ‘중앙이용원’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낸다.

